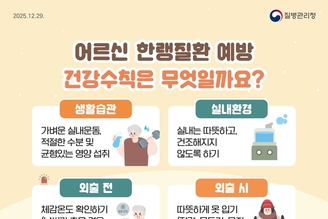[기고문 / 이대휘]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법안의 외피는 ‘스마트 농업 육성’과 ‘청년농부 지원’이지만, 실체는 농협이라는 거대 금융·유통조직에 농지 소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농촌 고령화와 방치 농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빚에 허덕이는 농민의 땅을 채권자인 농협이 흡수하는, 위험천만한 토지 집중 시나리오가 선명히 드러난다.
현재 농가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다수 농민은 농지를 담보로 지역농협 대출에 의존해 영농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상환 불능 농가의 토지는 자연스럽게 농협으로 귀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돈을 빌려준 기관이 담보를 넘어 토지의 실소유주가 되는 이 그림은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고리대와 담보를 통해 농민의 땅을 잠식하던 방식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스마트팜과 청년농 지원이라는 말은 장식에 불과하고, 본질은 농지를 매개로 한 부동산·금융 비즈니스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농협이 대규모로 농지를 사들이는 순간 농지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자본력 없는 청년 농부의 진입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된다. 결과적으로 땅 주인은 농협, 농민은 임대료를 내며 농사짓는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협이 농민의 땅을 소유하는 지주로 변신하는 아이러니 앞에서 “농협이 언제부터 지주 노릇을 하게 됐느냐”는 현장의 분노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 원칙을 정면으로 흔든다는 점이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며, 투기와 자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은 대한민국 농정의 최후 보루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예외’라는 이름의 균열을 내고 있고, 한 번 허물어진 둑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농협에 문을 열어주면, 기업과 금융자본, 각종 기관으로 농지 소유의 빗장이 순식간에 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농촌은 식량 안보의 현장이 아니라 수익률 계산이 우선되는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한다.
농촌 고령화와 방치 농지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그 해법이 농민의 마지막 생존 기반인 토지를 기관에 넘기는 방식일 수는 없다. 정치권이 말하는 ‘효율성’과 ‘혁신’이라는 단어 뒤에는 농민의 삶과 헌법 정신을 희생시키겠다는 무책임한 계산이 숨어 있다. 농민을 소작농으로 만들고 농협을 거대 지주로 키우는 법안은 농촌 회생책이 아니라, 농민의 숨통을 조이는 독배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농지소유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과도한 농가부채 구조를 해소하고, 농민이 땅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실질적 정책이다. 명분은 번지르르하지만, 내용은 위험천만한 이 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송옥주 의원과 정치권은 농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