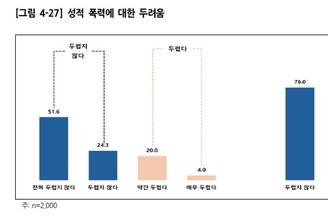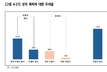“도대체 이 공사엔 누가 감독을 한 겁니까?”

2024년 하반기, 수도권 한 공공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으로 숨졌다. 감사원 조사관이 사고 당일 작성된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놀랍게도 ‘현장감독 책임자’ 란에는 어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발주기관은 “감리업체가 맡은 일”이라며 발을 뺐고, 감리사는 “계약상 지시권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감독자는 실종됐고, 책임도 함께 증발했다.

공공공사에서 반복되는 사고 뒤에는 늘 비슷한 말이 따라붙는다. “하도급은 금지였고, 계약상 책임은 없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4개 공공기관의 공사현장 70% 이상이 감독권한을 외주에 넘기거나, 실질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관리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 2024). 계약서에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조항을 집행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스스로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간 관리자’로 인식하는 순간, 감독 책임은 계약의 문장 속으로 증발하고 만다.
감리업체는 “지시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발주기관은 “형식상 하도급 금지는 했지만 몰랐다”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몰랐음’은 더 이상 면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들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동일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하다. 실명을 쓰는 책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되돌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모든 공공 발주공사에 ‘계약감독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책과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 법적 책임이 연계되어야 한다. 독일처럼 공사 승인 단계에서 감독자의 실명과 역할이 명시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독일 연방주 건축법(Bauordnung)은 ‘Bauleiter’로 명명된 감독자를 건축허가와 동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장 사고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실명은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장치다.
둘째, ‘하도급 금지’ 조항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위반한 기관에 대해 과징금, 입찰제한 등 실효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도급 금지만 있고, 이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절차는 제각각이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묵인 책임’도 함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위·감사원 등과 연계된 하도급 조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하도급 실명제’와 함께 작동되어야만 실제 감독 구조가 뿌리내릴 수 있다.
셋째, 외부에 맡겨버린 계약관리 시스템을 내부화하고, 통합 ‘공공감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계약담당과 현장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되 , 정보와 권한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된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 계약 내용, 하도급 이력, 감독자 기록까지 추적 가능한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통해 감독자 실명, 지시 내용, 위반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기록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발주기관 소속 감독관의 실명 지정과 단계별 감리 의무가 법제화된 모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대안은 각각으로도 의미 있지만, 단독으로는 구조를 바꾸기에 부족하다. 실명제는 권한이 없다면 껍데기이고, 조사제도는 처벌이 없다면 형식일 뿐이며, 플랫폼은 책임자가 없다면 ‘전자 보고 시스템’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제도 나열이 아니라, 단계별 정책 통합 로드맵이다. 제도 간 연계를 전제로 법령을 재정비하고, 감독 인력과 조사 권한, 시스템 운용을 하나의 구조 안에서 작동시켜야 한다.
공공기관은 단순한 비용 집행자가 아니다. 계약은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적 책무다. 실명 없는 조항, 책임 없는 계약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구조는 사람을 지워왔고, 이제는 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시간이다.
✔ 책임은 외주화 할 수 없다.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구조는 움직인다.
글/사진: 김한준 박사 【비전홀딩스 원장, Life-Plan전문가, 칼럼니스트】는 경영·교육·생애설계 분야 명강사. 공공기관 책임자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 리더십과 미래사회 전략을 주제로 명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사제보 charlykim@hanmail.net)